20세기 경제학 최대의 맞수… 이론적-감정적 대결 재구성
◇케인스 하이에크/니컬러스 웝숏 지음·김홍식 옮김/631쪽·2만5000원·부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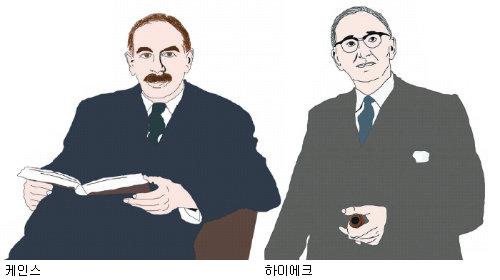
역사상 가장 화려한 조명을 받았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1883∼1946)와 그에 맞서 강고한 진지전 끝에 신자유주의의 30년 아성을 구축한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폰 하이에크(1899∼1992) 말이다. 사실 이 둘의 대결은 1990년대 이후 주류 경제학 교과서에선 한때 경제학계를 뒤흔들었지만 하이에크의 최종 승리로 귀결된 과거사로만 취급됐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찾아든 세계적 불황이 신자유주의의 가슴에 시장만능주의라는 주홍글자를 새겨 넣고 죽은 줄 알았던 케인스를 되살려내면서 ‘끝없는 논쟁’을 되살려냈다.
영국 저널리스트이자 전기 작가인 저자는 경제학사 최대 앙숙이라 할 두 사람의 대조적 삶을 교차시키며 그들의 이론적 감정적 대결을 흥미진진하게 재구성했다. 그러면서 둘을 토끼와 거북이에 비유했다.
열여섯 연하로 패전국 오스트리아 출신의 무명 경제학자 하이에크에게 케인스는 ‘롤 모델’이었다. 의외로 둘 사인엔 공통점이 많았다. 둘 다 귀족 가문은 아니었지만 부유한 학자 집안에서 태어났고 처음엔 다른 학문을 공부하다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학자의 길을 걷게 됐다. 180cm가 넘는 장신에다 자부심 덩어리에 논쟁에서 물러서는 법이 없었다.
하지만 평생 경제학계 스타로 귀한 대접을 받은 케인스와 달리 하이에크는 반평생 변방을 겉돌았다. 그는 197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고 밀턴 프리드먼(1912∼2006)이라는 든든한 우군을 만나 말년에 필생의 적수에게 승리를 거뒀다는 자부심 속에 숨을 거뒀다. 하지만 케인스가 누린 인기와 호사는 평생 누릴 수 없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제갈량과 사마의의 관계에 더 가깝다. 지략이나 대중적 인기에서는 제갈량이 사마의를 앞섰을지 몰라도 현실에서 승자는 사마의 아니었던가. 게다가 30년간 죽은 줄 알았던 케인스가 세계 경제위기가 닥치자 다시 살아나 하이에크의 후예들을 패퇴시키고 있지 않은가.
하이에크 경제학이 평시용이라면 케인스 경제학은 전시용이다. 자본주의라는 야구장에서 하이에크가 꾸준히 승수를 챙기지만 인기 없는 선발투수라면 케인스는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투입돼 극적 우승을 이끄는 구원투수다. 하이에크를 시조로 삼는 신자유주의의 기수였던 대처와 레이건의 전기를 쓴 저자도 자본주의를 두 번이나 구한 케인스에게 경의를 표하며 갤브레이스의 말로 책의 말미를 장식했다.
“자본주의가 최종적으로 굴복하게 된다면, 자본주의를 굴복시키는 힘은 케인스 같은 사람들을 마침내 무찔렀다고 축하하는 사람들의 요란한 환호성일 것이다.”
권재현 기자 confetti@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지금 뜨는 뉴스
-

고민정 “총리 하려는 與 인사 없을 것…레임덕 시작”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英 슬롯머신 도박게임 이름이 이순신?…서경덕 “중단하고 사과하라”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민주 “채 상병 특검법, 尹도 수사대상”… 與는 ‘법사위 사수’ 사활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