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교사 연수 카레이스키 3인
카레이스키, 현지선 한인이라는 뜻… 어눌한 말투에 고려인이냐 묻고
‘일하러 왔느냐’ 차별적 시선 느껴… 한국 배우고싶지만 살고싶진 않아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손녀인 고려인 3세 고타마라 씨(54·여)는 “한국 역사에 대해 아는 것은 할아버지 이야기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알마티의 ‘23번 한글학교’에서 한국어 교사로 일한다. 고려인 3, 4세대와 현지인이 수업을 듣는다. 고 씨는 재외동포재단의 도움으로 7월 26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이화여대에서 한국어 교사 연수를 받았다. 러시아,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한국어 교사 30명이 함께했다.
러시아의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이 되는 9월을 맞아 만난 이들은 여전히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소개했다. 자신이 성장하며 경험한 한국문화를 지켜가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이 자기 정체성의 뿌리임은 변함없다는 생각에서다.
다만 일부는 한국에서 살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여느 한국인과 다를 바 없이 생겼지만 어눌하게 한국말을 하면 “혹시 고려인이신가요”라는 질문이 나오고 “한국에 일하러 왔느냐”는 질문이 이어진다고 한다. 순간 차별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김 씨의 어머니는 한국에 취업비자를 받고 들어와 식당에서 일한다. 김 씨는 “고려인이라는 말 속에서는 ‘우리는 동포’라는 의미를 느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우크라이나에서 카레이스키는 이제 한인이라는 뜻인데 왜 같은 한국인이 우리를 고려인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러시아 사할린에서 온 이뱌체슬라브 씨(23·고려인 3세)도 “내가 한국인이라기보다는 러시아인이란 생각이 들 때가 많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은 고려인 3, 4세대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동포’라고 스스로 느끼고 인식하게 할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고려인이라는 말이 차별적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청소년기 이전에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늘려 우리도 강제이주의 아픔을 공유한 동포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지금 뜨는 뉴스
-

중장년 노후자금 노리는 코인 사기… 피해신고 33% 50대 이상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명품 ‘에루샤’ 국내 매출 4조 돌파… 사회기부는 18억 그쳐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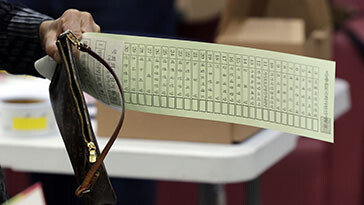
보조금 28억씩 챙긴뒤 사라지는 여야 위성정당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댓글 0